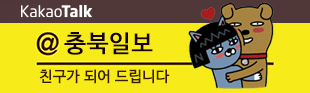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충북일보] 강은교의 시는 허무의 세계에 대한 통찰, 재생과 윤회의 동양적 상상력,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따뜻한 마음, 일상적 삶에 대한 포용과 긍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스런 호흡과 리듬이 강조되는 그녀의 시는 허무와 고독의 세계에서 생명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거쳐 일상의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죽음과 허무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초기, 민중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와 역사 문제를 탐구하는 중기, 일상의 생활을 사유하고 성찰하는 후기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본다.
1960년대에 시인은 죽음과 허무에 사로잡혀 존재를 탐구한다. 허무(虛無)는 초기부터 그녀의 시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유의 샘이다. 그녀는 존재에 깃든 허무를 응시하여 우리 삶의 본질을 허무라고 간주한다. 이때의 허무는 삶이 갖는 원초적 백지상태 또는 존재의 바닥을 의미한다. 이 허무의 심연에 접근하거나 벗어나는 과정이 주술적 제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의 초기 시에 물, 불, 피, 살, 뼈, 바람, 모래 등을 통한 주술적 무속세계, 비의적인 상징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시는 다소 변한다. 병을 앓고 난 후부터 시인은 개인과 사회가 균열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인간화 문제에 천착한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속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무속인의 운명이 고통과 신음 속에 놓인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체험을 무속적 요소와 결합하여 비극적 이미지의 시들을 낳기 시작한다. 무속의 형식을 시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울음 우는 자들의 아픈 몸과 혼을 어루만진다.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던 바리데기처럼 운명과 맞서 싸우며 운명과 화해한다. 무속을 통해 삶의 순환성을 수용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취한다. 개개인의 고통과 애환들을 풀어내주는 강신무의 역할
우리가 물이 되어 - 강은교(姜恩喬 1945∼ )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그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을 시로 수행한다. 즉 죽음과 허무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역으로 모성(母性)에 눈 뜨게 했고 생명에 대한 우주론적 인식을 싹틔운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삶과 죽음, 현상과 존재를 등가적 관계로 보고 사유한다. 이 시기의 시적 자아가 정착과 유목을 동시에 욕망하고,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런 변화 때문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시는 일상의 삶을 사유하고 성찰하기 시작한다. 시집 『우리가 물이 되어』에는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너그럽고도 넓은 품으로 삶과 세상을 끌어안으려는 사랑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 시집의 표제작인 「우리가 물이 되어」에는 물과 불이 함께 등장하는데, 물은 현대사회의 고립된 개체들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유동적 매개물이자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을 부활시키는 희망의 존재물로 그려진다. 반면에 불은 세상을 불태우고 벌하는 파괴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병든 현대사회에 대한 시인의 진단이 드러나는데, 흥미로운 건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불의 시간을 거친 후에 흐르는 물로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부분이다.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불은 이 세계를 병들게 하는 파괴적 죽음 이미지이면서도 이런 부정의 세계를 태워 없애는 역설적 이미지도 해석된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병폐와 모순에 맞서는 시인의 열망이 깃든 역설적 이미지 말이다. 시인이 1연, 2연에서 가정법 언술을 구사한 것은 물을 불의 상흔을 겪어낸 대승적 물로 상승시키기 위함 아닐까. 불의 고통과 번뇌, 불의 파괴와 죽음을 넘어선 후에야 삶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 그대와 내가 물로 만나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 함기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