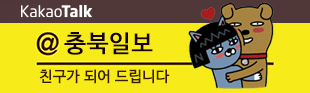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유리창>은 시인이 29세 되던 해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절제된 언어와 견고한 이미지로 그려 낸 작품이다. 시적 자아(시인)은 밤에 홀로 유리창 앞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한다. 어린 자식이 유리창에 붙어 날개를 파다거리다 사라지는 연약한 새가 연상되는가 하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은 유리창 너머에서 어둠이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다가 어느 새 어린 자식은 저 멀리 눈물어린 별로 반짝인다.
반짝이는 별, 어쩌면 산새처럼 날아간 어린 자식의 영혼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린 자식이 별나라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며 시인 스스로 위안을 얻는 심리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이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란 역설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작가나 시인이 아니더라도 글쓰기를 통해 고통도 슬픔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 필기구와 노트 한 권 준비하시고 마음 속에 독으로 남아 있는 미움, 슬픔, 아픔, 억눌린 감정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때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에 대한 감정을 지금부터 글로 써 보세요. 띄어쓰기 맞춤법 일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 20분 정도 써 보십시오.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그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치르듯 4일 정도 써 보세요. 정말로 신통하게 치유되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글을 쓰다 생각(감정)이 막히면 다른 주제로 옮겨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노트는 비밀 노트이니까 절대 타인에게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그 노트 불살라버리면 더욱 좋습니다.
/ 권희돈 시인
유리창 / 정지용(1902 - 1950)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