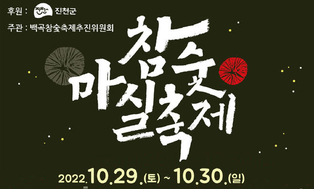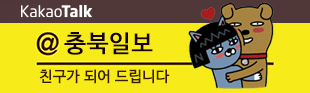고향에 돌아온 날 밤, 내 백골이 따라와 내 곁에 눕는다. 백골은 죽은 나의 육체로서 시인의 또 다른 분열된 자아를 대리한다. 우주와 통하는 방에서 백골은 점점 사위어가고 나는 소멸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상념과 반성에 잠긴다. 백골의 흰빛과 어둠의 검은빛이 대조되면서 절망은 점점 깊어가고 혼(魂)마저 운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밤을 새워 어둠을 짖어대는 지조 높은 개를 떠올리며 그 개가 자신을 쫓는다고 자책한다. 암담한 현실의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적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북간도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시인은 절망적 자기응시를 통해 피폐해진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가려 한다. 이 침묵 속의 다짐은 현실적 자아를 넘어선 이상적 자아의 결기가 서린 뼈아픈 다짐으로 또 다른 고향은 시인의 꿈과 염원이 담긴 절대공간이 된다. 식민지 현실로부터 해방된 조국,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세계, 모든 현실적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해방된 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윤동주는 스스로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라고 표현한 시인이다. 즉 그에게 시를 쓰는 행위는 시대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을 하나 내다 거는 일이었으며, 고뇌 속에서 행해진 순수한 저항이자 종교적 순교였다. 그는 시를 통해 누구도 선동하지는 않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반성하고 각성케 했다. 혁명, 평등, 자유, 박애 같은 거창한 이념들을 내세우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별과 어머니와 소녀 같은 순수서정을 지키려 했다. 그는 행동적 저항이 아닌 성찰의 시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혼(魂), 인간의 순수성과 동심을 지키려 했다. 그의 숭고한 시정신은 신념과 지조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 통렬한 칼날이 되어 되살아난다.
/ 함기석 시인
또 다른 고향 / 윤동주(尹東柱 1917~1945)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白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故鄕)에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