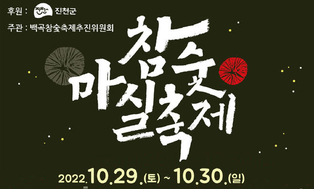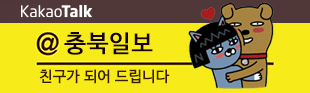눈물은 산등성이에 이른 사내의 심리상태를 표상합니다. 제삿날이라 하여 고향을 찾아오지만, 출발 지점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허허롭고 쓸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고향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가 더해져 마침내 산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큰집에 모이는 불빛은 차라리 희끗합니다. 허허로움에 서러움을 섞은 눈물을 강물에 쏟아내기에 강물이 붉은 겁니다. 강물이 타는 게 아니라 울음이 타는 겁니다. 울음을 태우는 건 설움을 태우는 번제(燔祭)입니다. 이 태움의 행위가 있었기에 마지막 연의 놀라운 반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내가 저것 보라며 감탄의 어조를 내뿜습니다. 앞의 광경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경이롭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가을 강은 첫 사랑의 속삭임 같은 시냇물 소리도, 실연으로 펑펑 쏟아내던 눈물도, 격정적인 감정도 다 녹여냅니다. 오직 生의 고결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바다에 다가와서 몸을 풉니다. 마치 온갖 번뇌망상,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다 겪어오던 삶이 종착지에 이르러 죽음에 합일되는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강가에서 거닐고 계신가요· 바다에 이르는 길이 절망적이지는 아니한지요· 그렇다면 바다에 이르기 전에 희망의 에너지를 찾아보십시오. 절망 속에는 희망의 에너지가 숨어 있답니다. 16세 소년에게나 80세 노년에게나 누구에게나 희망의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를 찾아내는 순간부터 자신의 역전드라마가 다시 쓰여 집니다.
/ 권희돈 시인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박재삼(1933 - 1997)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 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