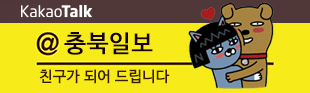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13.02.27 15:1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정환
수필가
이 지상의 삶에서 힘겹게 표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니면 막막한 외로움의 심연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 난 바다로 달려가야만 했다. 항상 그래왔다. 거친 바람소리 술렁이고, 갈매기 끼룩대는 바닷가의 비릿한 파도 냄새를 맡지 못하면 못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바다는 날 불러들였다.
푸른빛과 주황색의 경계지점으로 어둠을 뚫고 작은 배 한척이라도 다가오면 행복했다. 이제 좀 살 것 같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섬 그늘에 굴 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스르르 잠이 드는 '섬집 아기' 마냥 난 그때에서야 평화로웠다.
바다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 파도의 검은 빛을 응시하다보면 파도의 물빛이 따스한 목소리를 들려주곤 했다. 귓전을 울리는 조곤조곤한 음성들이 나의 혼란을 가라앉혀 주었고, 사나운 기세로 포효함으로써 내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을 그림자들을 하찮게 만들기도 했다.
바다의 리듬에 내 몸을 맡길 때면 밀물과 썰물의 순리처럼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지극히 무의미한 존재라는 이중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이 들고 나는 자리,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그 장소에서 난 이 지상의 뒤척이는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는 용도 폐기되어 개펄위에 주저앉은 목선들, 그 너머로 생존의 바다로 나간 배들이 만선인 채 의기양양하게 포구로 깃들 때, 난 소금기 절은 갯바람을 가슴깊이 들이 마시곤 했다.
대서양을 네 번이나 횡단했던 스티븐 캘러핸의 '표류' 이야기를 읽고부터 바다는 내게 또 다른 삶의 은유가 되었다. 항해란 영혼의 성지 순례와 같고, 바다는 성스러운 기도처라던 그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일 때조차 자신의 영혼을 세상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의 표류이야기는 내가 광대한 바다에 설 때마다 떠오르는 생존의 메타포가 되어, 작은 포구 앞에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처럼 밝게 빛났다.
지난 추운 날 찾은 남해의 섬은 오히려 제 몸의 깊고 무거워진 외로움을, 섬을 휘감는 검푸른 파도로 달래고 있었다. 나보다 더 짙은 외로움으로 뒤척이는 그 섬을 천천히 거닐며 이제는 내게 더 이상 달려갈 바다가 없을 거란 예감이 불쑥 솟아났다. 아니 달려갈 필요가 없음을 알아챘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내 몸을 스치는 바람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묻혀온 바로 그 바람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내가 몸 붙여 사는 삶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난 나를 따라 다니던 그 싱싱한 바람조차 느끼지 못했고, 나의 발아래 드리워진 어둠속에 얼마나 다채로운 빛깔을 숨기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
바다를 향해 달려간 내 발걸음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바로 이곳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내가 표류하면서도 축제처럼 기뻐하고, 뼈저리게 외로워하면서도 맘껏 웃을 수 있는 곳이 이 곳임을 입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색이었던 셈이다.
내가 살던 대지에서도 빛을 극복한 저녁이 석양노을로 붉게 타 올랐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면 밤을 이긴 빛이 하늘에서 파란 물빛으로 그 푸른색을 더해갔었다.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들숨과 날숨처럼 거칠게 호흡하는 파도들, 태곳적부터 넘실대었을 그 파도들의 이랑마다 이미 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겨울 꽃이 지는 자리마다 진작부터 봄의 약속 가득한 꽃망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난 오늘도 바람 부는 바다로 달려갔다. 생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기나긴 인생 항해에서, 마침내 발견하여 도착한 항구는 내가 지나온 그 머나먼 항로를 명백히 증명할 터였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랭킹 뉴스
- 1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충북 연고 20대 부상자 1명 확인
- 2캠코 충북지역본부, 51억 원 규모 88건 매각
- 3이태원 핼러윈 참사 -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 4이태원 핼러윈 참사, 충북 사망자 1명 확인…사상자 2명
- 5(1보)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에 "참담…국가 애도 기간 지정"
- 6이태원 핼러윈 참사 - 핼러윈 행사 줄줄이 취소 "애도 동참"
- 7할로윈참사 - 세종시민 연락두절 6건에 7명
- 8오류로 가득찬 정지용문학관
- 9제천 동명초 학교축제 '얘들아, 할로윈 축제 처음이지'
- 10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Hot & Why & Only
-
Hot

기업유치·저출산 극복 지자체 돈 더 준다
[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
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
Only

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충북일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다 화를 당할 뻔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원대학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이었던 29일 밤 10시께 일부 재학생 몇명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을 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를 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울에 갔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다행히 화를 면한 학생이 있는 반면 이 학교 졸업생 중 1명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이 졸업생은 충북에 연고를 두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민 2명도 사상자 명단에 올랐다. 청주에 연고를 둔 22살 A씨가 숨져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진천에 연고를 둔 23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에선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있어 충북지역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연고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실시간 댓글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