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희
객원논설위원
1040년에서 1057년까지 재위했던 스코틀랜드의 왕 '막 베하드 막 핀들라크'의 아내 '그루오크 잉겐 베터'가 모델로, '막 베하드' 왕과 재혼했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일화가 없다. 희곡에서는 이름 없이 그냥 맥베스 부인(Lady Macbeth)으로 등장한다.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용맹한 장군인 글라미스의 영주 맥베스는 친구인 뱅코와 함께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의 예언을 듣는다. 맥베스가 코더의 영주를 거쳐 왕이 될 것이며 뱅코의 자손들도 훗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맥베스와 뱅코는 처음엔 그 말을 흘려 들었지만 '던컨 왕'이 대승을 거둔 맥베스에게 코더 영주의 작위를 하사하자 예언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맥베스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마녀의 예언을 털어놓자, 야심가였던 맥베스 부인은 남편에게 던컨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 부추긴다. 하지만 맥베스는 차마 왕을 죽일 수 없어 고민한다. 그가 던컨 왕 시해를 망설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왕과 친척으로 얽혀 가족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신하인 자신이 주군을 해칠 수 없었으며, 세 번째는 접대의 관습에 따라 집주인인 자신이 초대한 손님인 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였다.
남편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속이 터진 맥베스 부인은 남편대신 자신이 직접 던컨을 죽이려 들지만 너무나 자신의 아버지 모습과 흡사한 던컨 왕의 모습에 놀라 단행을 하지 못한다. 실제 역사에서도 던컨 왕은 '그루오크 잉겐 베터'의 큰아버지였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던컨 왕을 처단하고 남편을 왕위에 올려 왕비가 되지만, 잠을 자고 있던 큰 아버지의 살해를 방조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한다. 이것이 비극 '맥베스'에 등장하는 '레이디 맥베스'의 일생이다.
맥베스 부인은 동정심과 유약함 같은 여성성보다 야망과 권력욕, 과감함 같은 남성성이 강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맥베스 부인은 물불 가리지 않고 남편의 출세를 돕다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다.
레이디 맥베스가 잔혹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던컨 왕을 살해하고 그 책임을 술 취한 경비병에게 돌린 맥베스의 야비한 책임회피와 결이 비슷하다. 부인이 누구보다 괴로워하며 자살하자 남편 맥베스가 독백한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도'는 대사라기보다 한 편의 시다.
'인생은 그저 걸어 다니는 그림자/실력 없는 연극배우//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종종거리며 돌아다녀도/얼마 안 가 잊히고 마나니//마치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와 같아/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결국엔 아무 의미도 없도다.'
얼마 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레이디 맥베스'라 평했다.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렸다가 함께 몰락한 맥베스 부인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관여 스타일이 닮았다는 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역시 보통의 아내는 아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예능 프로까지 접수한 설 여사의 활동에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빗대며 견제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 후보 배우자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순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김문수 후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결과가 어떻든 두고두고 회자될 새로운 배우자 상이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

청주시 특례시 기준 차고 넘친다
-
2

6월 수능 모평 지원 N수생 2011년 이래 최대
-
3

충북 농산물, 브랜딩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
4

청주공예비엔날레 D-100, '세상 짓기' 프로젝트 본격 돌입
-
5

21대 대선 사전투표 막 올라…충북 154곳서 29·30일 오후 6시까지
-
6

"코딩 실력 내가 최고"… 39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개최
-
7

5월 충북 기업 경기 회복세… 전반적 기대감
-
8

충북 과수화상병 5개 시·군으로 '확산'…누적 피해 16곳 5.27㏊
-
9

글로컬대 지정 '충북 홀대'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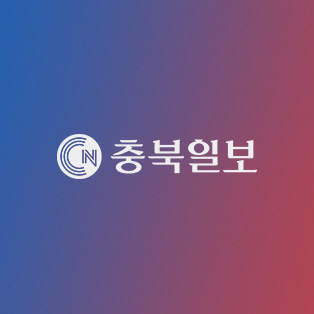
조길형 충주시장 "LNG발전소 포기 못해"…주민 반대 속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