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두
시인·괴산문인협회장
적선(積善)은 착한 일을 쌓거나 동냥질에 응하는 일을 말한다. 적선의 반대편에 인색(吝嗇)이란 말이 있다. 인색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쳐서 자기 것만 아껴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이기주의로 비호감의 표상이다. 인색하기보다는 적선하는 것이 좋음은 당연할 것이지만 현실 상황에 부닥치면 생각대로 잘되지 않는다.
나는 최근 내가 겪은 일로 이 적선과 인색을 생각하게 되었다. 시골로 귀촌해서 생활하는 나는 설 쇠러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고속버스를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다. 마침 지하철 빈자리가 있어 여느 때처럼 돋보기를 끼고 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시골 농부 목소리 같은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백 원짜리 껌 하나 팔아달라고 왔습니다, 자일리톨껌은 천 원입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장애인 전동차를 운전하는 백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다 "어떻게 하지?" 나는 머뭇거리다 껌이라도 하나 살까, 하다 아냐 그냥 천 원이라도 드리자 마음먹고 벌써 저만치 가는 전동차를 따라가 할머니 앞자락에 접은 천 원을 드렸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다시 그 투박하고 메마른 음성이 들렸다.
바로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 모습이 "하이고 겨우 천 원이야"하는 매운 눈초리 같아 속으로 찔끔했다.
그리고서 지하철 칸 끝이라 다시 돌아 나오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했다. 그 백발의 할머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몸이었다.
"아 그래, 너는 겨우 천 원짜리 한 장밖에 적선할 줄 모르니?"라고 내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사건 아닌 사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에게 길게 생각하는 재료를 주었다. 지나온 날에 비추어 보면 나는 평소 선뜻 적선하지 않는 인색한 처신을 해 온 것 같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적극적인 용기를 내지 않았다. 마음이 일어난다면 바로 손을 내밀어야겠지만, 선뜻 손이 먼저 안 나가는 것이다.
일찍이 홀로 되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 오는 내 작은 누님은 봉사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봉사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 그래선지 누님의 얼굴은 항상 편안하고 너그러워 보인다. 존경스럽다. 누님의 그런 모습에서 봉사와 적선이 남을 위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지하철에서 적선을 구하던 그 백발 할머니가 다시 떠오른다. 할머니는 몸이 불구이니 다른 생활수단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단순히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껌을 팔아 달라고 한다. 스스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것은 안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좀 더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된다.
적선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내야 하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사회도 인색에는 소극적이고 봉사와 적선에는 더 적극적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

충북 환경단체 "'금주 구역' 청남대 주류 판매 불법"…음주 조장 규탄
-
2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학교생활 힘들어 홧김에 범행"
-
3

"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
4

충북 정치권 대선 준비 '속도'…선대위 구성·조직 정비
-
5

전공노 충북본부 "위법행위 조장 관제 서명운동 반대"
-
6

옛 속리산유스타운, '속리산 포레스트'로 재탄생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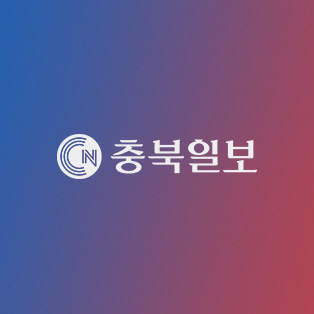
칼부림 학생폭력 예방대책 마련해라
-
8

증평공고, 기숙사·그린스마트스쿨 준공
-
9

충주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개최
-
10

갈라지고 떨어져…옛 연초제조창 굴뚝 '긴급 안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