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에 인구 외에 면적이나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사무처의 이런 분석은 청주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이다.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모순된 기준 때문에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인구 기준은 50만 명 이상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기준을 50만 또는 80만 명으로 제시했다. 그래야 청주시 등 비수도권 5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들의 인구 늘리기는 현재 한계에 이르렀다. 수도권 집중화 탓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반영 기준 완화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관련법 취지와도 부합된다.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도 앞서 지난 1월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만 되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충분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3년째다. 하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100만 명이란 기준이다. 수도권에서 이 기준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지방도시에서 인구 100만 명은 꿈의 숫자다.·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를 통합해 인구 100만 명을 넘겼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수년 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지도 모른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하고도 인구 1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인구 100만 명은 비수도권 도시엔 그저 희망사항이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 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기 있다. 특례시 기준 완화는 이번 대선을 거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청주시는 첫 번째 충북 지역 대선 건의과제로 제출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대도시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가 필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국회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22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출범 때부터 시끄럽긴 했다. 그렇다고 지역의 국회의원마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무와 소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
지금은 대선 기간이다. 자신이 속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정당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관련법 개정이 가능하고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이다.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모순된 기준 때문에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인구 기준은 50만 명 이상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기준을 50만 또는 80만 명으로 제시했다. 그래야 청주시 등 비수도권 5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들의 인구 늘리기는 현재 한계에 이르렀다. 수도권 집중화 탓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반영 기준 완화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관련법 취지와도 부합된다.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도 앞서 지난 1월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만 되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충분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3년째다. 하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100만 명이란 기준이다. 수도권에서 이 기준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지방도시에서 인구 100만 명은 꿈의 숫자다.·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를 통합해 인구 100만 명을 넘겼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수년 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지도 모른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하고도 인구 1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인구 100만 명은 비수도권 도시엔 그저 희망사항이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 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기 있다. 특례시 기준 완화는 이번 대선을 거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청주시는 첫 번째 충북 지역 대선 건의과제로 제출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대도시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가 필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국회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22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출범 때부터 시끄럽긴 했다. 그렇다고 지역의 국회의원마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무와 소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
지금은 대선 기간이다. 자신이 속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정당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관련법 개정이 가능하고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

청주시 특례시 기준 차고 넘친다
-
2

6월 수능 모평 지원 N수생 2011년 이래 최대
-
3

충북 농산물, 브랜딩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
4

청주공예비엔날레 D-100, '세상 짓기' 프로젝트 본격 돌입
-
5

글로컬대 지정 '충북 홀대'
-
6

"코딩 실력 내가 최고"… 39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개최
-
7

5월 충북 기업 경기 회복세… 전반적 기대감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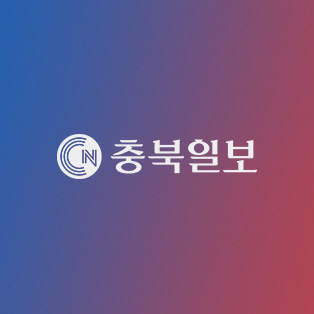
조길형 충주시장 "LNG발전소 포기 못해"…주민 반대 속 강행
-
9

21대 대선 사전투표 막 올라…충북 154곳서 29·30일 오후 6시까지
-
10

충북 과수화상병 5개 시·군으로 '확산'…누적 피해 16곳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