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은 대문이 없다. 차가 마당까지 거침없이 들어간다. 동네에 대문이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다. 창고문에도 시건 장치가 없고, 출타 중에도 방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도 여태껏 도난사고 한 건 없다. 우리 동네는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평화로운 따사로움이 감돈다.
차 소리가 나면 방문을 열던 어머니인데, 아무 인기척이 없다. 들에 가셨나 적막하다. 주위를 보니, 이미 캐 놓으신 마늘이 건물 천장에, 한 접씩 묶어 횡렬로 걸어놓은 게 보인다.
어머니가 수족같이 여기는 똥구루마 손잡이에 뽀얀 흙먼지가 묻은 채, 덩그러니 서서 있다. 휴대폰을 행방을 추적하니 고추밭에 계셨다. 일이 거의 끝났다고 하신다. 비가 안 와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시더니, 결국 지하수를 퍼 올려 고랑에 물을 대시는 모양이다. 똥구루마를 그늘로 들여와 깨끗이 닦고 점검을 했다. 양 바퀴에 기름도 쳐주고 볼트를 조여 주었다.
어머님은 근 30여 년을 같이 손수레와 생활을 함께하셨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손수레를 똥구루마라고 부른다. 지금도 축사에서는 손수레로 두엄을 운반하기에, 그렇게 불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손수레는 평생 똥을 묻힌 적도 없었는데, 축사의 똥구루마와 동급으로 호명되다보다. 먹물 좀 배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외발수레라고 부른다. 외발이라 하니까 장애성의 외발이 아니고, 독립된 완성품이다. 똥구루마와 수레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똥'자가 들어가면, 왠지 지저분하고 품격에 비하성 발언이다. 그렇지만 어머니한테는 사랑을 받는 소중한 친구같은 물건이다.
어머니는 똥구루마와 함께한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똥구루마도 나이가 들어서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고 레일이 녹슬고 있었다. 주인님이 젊어서부터, 일 욕심이 많은 탓에, 결국 농기계 수리점에서 용접 수술을 하여 간신히 고쳐쓰고 있다. 지금은 튼튼해져서 무거운 짐을 싣기는 하지만 각별히 조심을 한다. 비록 외발이지만, 쓰임새는 두발, 네발보다 훨씬 많다. 좁은 길, 또는 밭고랑에서도 아무 지장 없이 쏜살같이 다니고, 속도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급히 출발도 할 줄 모르고, 유료가 들지 않아 걱정거리가 절대 없다. 동력이 아닌 사람의 근력에 따라 움직이기에 농사일에 참으로 편한 물건이다.
바퀴를 손질하고 있는 사이에 똥구루마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즈음 들어, 주인님도 힘이 부치시는 거 같단다. 젊어서는 그의 등짝에 농자재를 잔뜩 싣고, 거뜬히 쏜살같이 다니셨는데, 이제는 비료 한 포대도 힘들어하신단다. 손잡이를 잡는 완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속도도 많이 느려지셨다. 운전 기술도 어눌해졌다고 속이 무척 상하다고 한다. 한 번은 비료 한 포대와 농자재를 잔뜩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일부러 옆으로 쓰러져 물건을 나누어지게 했다고도 한다.
처음에, 철물점에서 주인님의 간택(?)을 받고 이 집의 구성원이 될 때다.
우리 주인님은 젊으 셨다. 일부종사의 심정으로, 주인님의 수족이 되어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면서 생을 함께 마감하기로 일찌감치 작정했던 터라, 누구보다 주인님의 일상사를 잘 알고 있단다. 그 젊고 탱탱한 얼굴이 안쓰럽다. 세월에 못 이겨 얼굴에 팔자 주름과 굵게 패인 주인님의 인생 계급장을 보면, 말없이 가버린 지난날들이 서글프다.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 야속하고, 마음이 무척이도 아프다고 하며 추억을 들려준다. 젊었을 시절부터, 주인님은 자기를 많이도 이용했지만, 끔찍이도 아껴주셨다고도 한다.
멀리서 들판길을 부지런히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일복 바지 옷에 장화를 신고, 급한 몸짓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음걸이가 어둔하시다. 긴 세월, 이고 오신 삶의 무게가 이젠 힘이 부치시는 모양이다. 올해 88세 어머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 일 못하게 하면,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 가튼겨. 아직은 괜차너" 라고 하시는 어머니. 그러면서도 누우실 때는 "아이쿠 허리야…. 장부처럼 드세기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들리는 애잔한 소리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을 것 같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건가.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콧등이 시큰해 진다.
민경준 수필가

민경준 수필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 수강
효동문학상 수상
서울 강남경찰서 정년퇴임
충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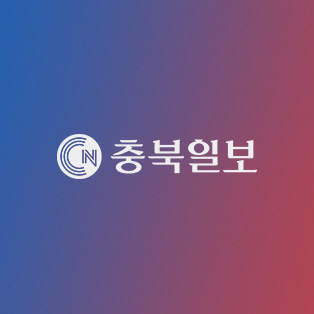





 동영상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