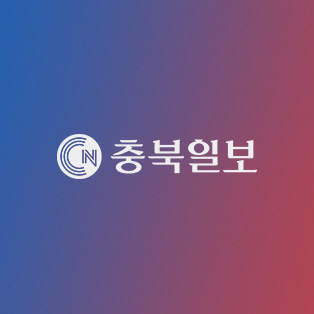청주 '만득이 사건' 원인은 마을공동체 붕괴
19년 간 축사서 노예생활 이웃·지자체 등 무관심
통리반장 시스템 부재…언제든지 유사사건 재발
마을별 행정조직 담당제, 순찰·방범활동 등 강화
2016.07.21 19:14:40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마을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이웃과 읍·면·동사무소 조직의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이웃과 읍·면·동사무소 조직의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대비 1/3이 넘는 각종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복지예산 전달과정에서 중간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예산 전달체계는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복지시설~수혜자 등으로 다단계 방식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정한 100%의 사례별 복지예산이 실제 수혜자가에게 전달되는 것은 고작 10~20%에 그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대신 광역·기초단체와 복지시설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중간자비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관련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관가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의 세대를 방문하고 있는 우체부를 '복지전달자'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복지시스템이 '만득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곧바로 마을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마을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리반장의 역할은 막강하다. 읍·면·동사무소의 요청을 받은 통리반장은 해당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의 세대를 방문하고 있는 우체부를 '복지전달자'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복지시스템이 '만득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곧바로 마을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마을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리반장의 역할은 막강하다. 읍·면·동사무소의 요청을 받은 통리반장은 해당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족 숫자는 물론, 재산현황까지 짐직할 수 있고, 특히 구성원들의 가족 전입과 퇴거 등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년 동안 좁은 축사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만득이 사건'은 이웃의 무관심 또는 묵인, 실핏줄처럼 연결된 복지시스템의 오류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등 여의도 정치권은 이번 '만득이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통리반장과 함께 월 1~2회 정도 전국의 모든 세대를 방문·확인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농촌은 물론, 도심 거주자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 또는 골목(마을) 슈퍼, 동네목욕탕 등 대중이용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 파출소 시대에서 시행됐던 순찰제도 및 방범활동 강화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전수조사에 돌입하는 '뒷북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조직 담당제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도 관건이다.
충북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만득이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런 상황에서 19년 동안 좁은 축사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만득이 사건'은 이웃의 무관심 또는 묵인, 실핏줄처럼 연결된 복지시스템의 오류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등 여의도 정치권은 이번 '만득이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통리반장과 함께 월 1~2회 정도 전국의 모든 세대를 방문·확인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농촌은 물론, 도심 거주자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 또는 골목(마을) 슈퍼, 동네목욕탕 등 대중이용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 파출소 시대에서 시행됐던 순찰제도 및 방범활동 강화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전수조사에 돌입하는 '뒷북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조직 담당제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도 관건이다.
충북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만득이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